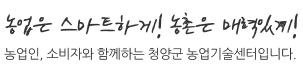독일 배우기가 한창이다. 독일금융은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연합(EU)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고, 튼튼한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강한 독일경제의 기초체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동독과의 통일 이후 빠르게 진행된 사회통합과 지역간의 균형성장은 외부의 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독일의 힘이다.
독일은 공업국가이면서도 농업이 강한 나라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40%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고 2005년 이후 농업소득은 26.3% 성장했다.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도 55.8㏊나 되지만 64세 이상 농가는 5.3%에 불과해 대농규모이면서도 젊은 영농인들로 구성돼 있다. 독일은 우유·양돈 등 축산업의 비중이 49.8%이고 나머지는 호밀·감자·사료작물 등의 농업이 차지한다.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라고 믿는 국민의식, 푸른 초지와 조화를 이룬 공원 같은 전원풍경, 주말마다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지금의 독일농업의 모습이다.
척박한 토지와 변덕스러운 독일의 기후 특성으로 농업부문 교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이농현상은 지속되고 있지만, 농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독일의 농업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30만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일농협연합회(DRV)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농업은 결코 어둡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농협연합회는 1948년에 설립됐으며, 2452개의 농식품 농협을 대표한다. 독일 전역의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원예업과 포도주사업, 라이파이젠은행의 일부 신협까지 포함한다. 독일농협연합회 소속 농협의 2012년 매출액은 501억유로로 전년 482억유로 대비 4%나 늘었다. 독일 내 시장점유율도 유가공 70%, 농자재 50%, 신선농산물 45%, 포도주생산의 33%를 각각 차지한다.
독일농협연합회는 농민사업과 지역사회의 가치실현을 공동 목표로 하는 회원간 협동의 원칙을 중시한다. 특히 조합연합회의 성격에 맞게 독일정부와 유럽연합에 대해 농민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회원들에게 유럽농업의 시장정보를 제공하며 세금·보험·환경문제 등에 대한 조언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제품·포도주·신선채소 등 품목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채널역할을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력도 촉진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 등을 통해 독일농협연합회는 독일 생산자 조직을 강화시키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독일농협연합회의 매런 큐런 대외담당 팀장은 “양극화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해결 등 한국의 경제민주화 실천에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매런 팀장은 또 “협동조합이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견제는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독일인구 4명 중 1명이 협동조합에 가입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며 골목 상권을 지키고 지역농산물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립 영농을 위한 자신감 회복 노력과 지역농산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독일 농민에게 최근 들어 고민거리가 생겼다. 유럽연합(EU) 집행위에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7% 이상의 농경지에 대해 휴경을 권유하고 있고 직불금 가운데 30%를 이러한 환경보전조치를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독일 농업계가 ‘농가의 생산성 증대 노력’과 더불어 ‘환경생태계 보호’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