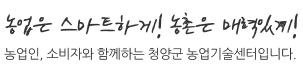이영욱씨가 출하를 앞둔 만가닥버섯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일단 이천 인근에 재배사를 빌려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판로도 막막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무작정 매달렸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했어도 버섯 종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그렇게 그는 여주 등지에서 임차농으로 일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 갔다. 하나둘씩 경험이 쌓이며 버섯 재배에 자신이 붙자 그는 지금의 이포대교 근처에 부지를 마련해 재배사를 지었다. 지난 2003년의 일이다.
자신이 있었던 만큼 그가 생산한 느타리버섯은 순풍에 돛단 듯 팔려 나갔다. 한해 1만5000병을 생산할 정도로 성공한 것. 하지만 그는 느타리버섯 대신 다른 작목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선진지 견학차 찾은 일본에서 만가닥버섯을 접한 뒤부터다.
“재배농가가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느타리버섯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눈에 든 것이 만가닥버섯이죠. 일본인 입맛에 맞다면 우리한테도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재배기간이 발목을 잡았다. 40~50일인 새송이·팽이버섯에 비해 110일로 2~3배가 길었던 것. 하지만 그는 제대로만 생산해 내면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뛰어난 기능성에 쫄깃한 식감을 지닌 데다, 저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그는 일단 만가닥버섯을 시험재배하며 자신만의 기술을 터득해 나갔다. 생육기간이 긴 작목의 특성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재배사 청결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관계자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또 배양기간(90일)을 초기(20일)와 후기(70일)로 나눠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특히 싹이 돋는 초기에는 배양실에 외부 공기를 끌어올 때도 필터로 걸러낼 만큼 신경을 썼다.
이와 함께 이씨는 톱밥과 미강, 옥수수속대를 섞어 배지도 직접 만들었다.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며 생육환경에 신경 쓴 건 물론이다.
이런 노력으로 이씨는 요즘 하루에 5000병(약 800㎏)의 만가닥버섯을 생산해 한 해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 생협 등에 납품하는 만가닥버섯은 수량은 적지만 단가가 높아 1.5㎏에 1만원을 호가한다.
2310㎡(700평)의 재배사를 갖춘 농업회사법인은 그가 자신감 하나로 영농에 뛰어든 지 17년 만에 일궈낸 쾌거다. 그의 이름 앞에 성공한 농업인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만가닥버섯 생산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 새로운 소득작목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그는 “노루궁뎅이버섯을 가공해 진액으로 만드는 등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