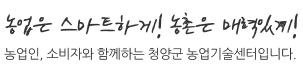지방의 한 고춧가루 제조업체에 중국산으로 표기된 냉동고추 포대가 잔뜩 쌓여 있다. 중국산 냉동고추는 관세가 건고추의 10분의 1인 27%에 불과해 수입업체들이 선호한다.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먹자골목. 이곳에서 김치찜 전문식당을 운영 중인 박미영씨(가명)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 대부분이 냉동고추나 다진양념 같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국산 고춧가루는 품질이나 빻는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당 1만4000~1만7000원을 줘야 하는 반면 중국산은 그 절반인 7000~9000원대면 구입할 수 있다”면서 “음식장사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큰 문제만 없다면 저렴한 식자재를 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웬만한 식당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선지 손님들의 거부감도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부터 9일까지 닷새간 기자가 서울 송파·강동지역의 요식업소 10곳을 돌아본 결과, 국산 고춧가루만을 쓴다고 응답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7곳 가운데 4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만, 3곳은 중국산과 국산을 섞어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기자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물어본 데 따른 대답이다. 10곳 중 4곳은 고춧가루에 대해 별도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로선 업주에게 묻지 않는 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길이 없고 물어보더라도 업주가 거짓으로 대답할 경우엔 실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셈이다.
중국산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7곳의 모든 업주가 ‘가격이 싸서’라고 답했다. 일부는 품질도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다. 매콤한데다 색도까지 높아 빨간 국물을 내야 하는 짬뽕·순두부 등을 만들 땐 국산보다 낫다는 것이다.
충북지역의 중견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인 김철우씨(가명)는 “업계에 종사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국내 생산량이 급감했던 2010~2011년을 기점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나 고급 김치 제조업체 등을 제외한 대형거래처 상당수가 가격이 싸고 안정적인 중국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을 취급하지 않고는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이다보니 전국의 고춧가루 제조공장 가운데 국산만을 취급하는 곳은 30%가 채 안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산(주로 중국산) 건고추는 2014년산 기준으로 지난해 8월~올 7월25일까지 10만4181t이 수입됐다. 2013년산 수입량(2013년 8월~이듬해 7월) 9만6407t에 비해 8%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산 자급률은 5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