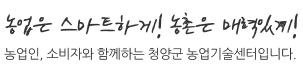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정부 “미검사는 쌀 고품질화에 역행”=권장사항이던 쌀 등급표시제가 의무화된 것은 2011년 11월이고, 지금의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9월이다. 이 과정에서 등급이 5단계(1~5등급)에서 3단계(특·상·보통)로 줄었지만, 미검사 항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런 예외조항이 등급표시제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여론 수렴은 물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에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미검사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양곡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는 “등급표시 위반에 걸린 업체는 과태료 외에도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엄청난 벌칙을 받는다”며 “벼 매입자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업체의 손익은 물론 생존까지 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검사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업계 “미검사 폐지는 시기상조”=양곡업계는 미검사 항목 폐지가 범죄자를 양산하는 조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쌀 등급표시제는 수분·싸라기·분상질립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결정되는 구조다. 유통과정에서 쌀알이 파손되거나 품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측정한 등급과 소비지 판매 과정에서의 등급이 다를 수 있다. 또 기기마다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양곡업체는 출하할 때 아예 등급을 한단계 낮추기도 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운송·판매 과정에서 등급이 바뀔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을 생산자(도정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표시된 등급과 실제 품위가 맞지 않는다는 음해성 고발이나 식파라치가 활개를 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등급표시가 어려운 영세업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임도정공장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농협 RPC야 괜찮겠지만, 우리처럼 인력과 장비 구비가 어려운 정미소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장비를 지원하거나 분석을 대행하는 조치를 취한 뒤 미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등급 기준 마련해야” 주장도=이번 기회에 등급표시 기준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각국의 최고 등급 쌀 중 싸라기 허용 범위는 한국이 3%, 미국은 4%, 일본은 5%로 우리가 가장 엄격하다. 분상질립 기준도 우리가 훨씬 깐깐하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우리 쌀의 등급 하향화와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와 농협은 미검사 폐지가 어렵게 키운 브랜드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싸라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몇몇 조생종·중만생종 품종은 태생적으로 최고 등급을 받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품위가 일반 쌀에 비해 떨어지는 친환경 쌀,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 내의 즉석도정 쌀은 별도의 기준을 만들거나 표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정해놓고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면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며 “일본처럼 임의표시가 좋은지 먼저 따져봐야 하고, 의무표시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정부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