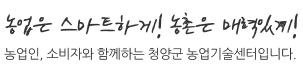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농업’을 보면, 우리나라 칼로리 자급률은 최근 3개년(2009~2011년) 평균 42.5%다. 이는 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꼴찌나 다름없다.
칼로리 자급률은 곡물·육류·채소·과일 등 음식물의 하루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국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데이터베이스(FAO STA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칼로리 자급률은 2009년 44.1%, 2010년 42.6%, 2011년 40.7%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기준연도의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해 1위 호주(162.6%)와 4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전 세계의 3개년 평균 칼로리 자급률은 99.9%로 거의 100%에 다다랐고, OECD 회원국의 평균은 90.8%로 우리나라의 2배를 넘었다. OECD 상위 국가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미국 등 농업 선진국이 차지했으며, 이들 국가의 자급률은 100%를 훌쩍 넘겼다.
3개년 평균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이웃 일본이 유일했다. 일본의 평균은 41.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감소세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식량 안보에 경각심을 갖고 품종 개량에 힘쓰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는 구호성 주장으로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OECD 최하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차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자급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료용 작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로 시선을 돌려도 우리나라의 성적은 초라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곡물자급률은 25.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국가의 곡물 국내 소비량 가운데 국내 생산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곡물자급률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곡물자급률이 15.6%로 우리보다 낮은 32위를 기록한 네덜란드는 곡물을 제외한 채소·육류·유지류 등의 품목에서 높은 자급률을 보이며 칼로리 자급률 126%(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한울 농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칼로리 자급률은 지난 10년간 21.3%포인트 줄었다”며 “식단의 서구화로 수입식품 비중이 커진데다 농경지 면적 감소와 함께 생산기반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