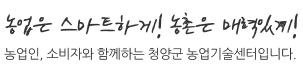귀농어·귀촌법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법률이다.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했고, 귀농·귀촌인 정의,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정착지원, 실태조사, 통계작성,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정 등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문제는 귀농어·귀촌법에 규정한 귀농·귀촌인 정의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귀촌인의 정의가 문제다. 귀농어·귀촌법에서는 귀촌인을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귀촌인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서울에서 경기 남양주 등 위성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나 직장인, 아파트 거주자 등이 모두 귀촌인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6월 말 ‘2015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발표한 직후 논란(본지 2016년 7월4일자 2면 보도)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2015년 귀촌인구를 2014년(3만3442호)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31만7409호로 발표,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이 많았다.
귀농인도 농업경영체·축산업명부·농지원부 등에 등록되고 농촌 이주 전 1년 이상 도시거주자로 귀농어귀촌법이 정의하고 있어, 1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통계는 지난해까지 내부 방침에 따라 조사방법을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귀농어·귀촌법의 귀농·귀촌 정의에 따라 통계조사가 진행됐다”며 “귀농어·귀촌법상의 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전문가들은 “엉터리 귀농·귀촌 통계 논란과 함께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수립에 차질을 야기해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게 귀농어·귀촌법상의 귀농·귀촌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농업전문가는 “전원생활 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수치로만 집계한 귀촌인 통계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귀농어·귀촌법상 귀농·귀촌인 정의를 새롭게 설정하고, 귀농·귀촌 통계작성 방법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계는 올해부터 통계청으로 넘어간 귀농·귀촌 통계를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 귀농·귀촌 통계조사의 현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