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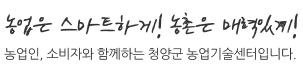
농업새소식
| 제목 | 시골 중국집 ‘산골짜장’의 하루 |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08-29 | 조회 | 1387 |
| 첨부 | |||||
|
재지에도, 남쪽 끝 작은 섬 마라도에도 중국집은 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모두 같은 중국집은 아니다. 도시 의 중국집은 도시만의 색깔을, 관광지의 중국집은 관광지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중 시골 중국집의 색깔은 낡은 장화에 묻은 ‘흙색’일 것이다. 밭에서 피 뽑다가 바지에 묻은 흙을 미처 털어내지도 못한 채 허기를 채우러 오는 곳, 모내기하느라 흙범벅이 됐지만 손만 쓱쓱 닦아내고 먹을 짜장면을 논두렁까지 배달해주는 곳, 농번기 에 함께 바쁘고 농한기에는 덩달아 한가해지는 곳, 시골 중국집의 하루를 들여다봤다. 봉산이 뒷산인 이 산골마을에서도 맨 안쪽,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이영주(62)·김태숙씨(55) 부부가 산골짜 장의 주방을 여는 시간은 아침 7시. 주방장인 남편 이씨가 하루 동안 팔 짜장을 볶는다. 웍(중국요리용 냄비)에 기름을 넣고 춘장을 달달 볶다가 전날 아내 김씨가 준비해둔 양파와 지난 장날 인월면 인월리 인월장에서 사다 놓은 호박·당근까지 넣고 볶아주면 짜장 준비 끝.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 하루 장사 준비를 다 마친 것이다.
“요즘처럼 손님이 별로 없는 날에는 남편이 다른 데 일하러 나가요. 아침에 짜장 볶아두고 나가면 나머지는 제 가 혼자 하죠.” 짜장면만 된다. 손님이 오려나? 구경 한번 못할 때도 있다. 비어가는 중국집을 채운 것은 동네 주민들이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양이 손도 아쉽다는 시골, 너 나 할 것 없이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나가니 밥할 사람도, 시간도 없는 것이 요즘 형편이다. 그러니 지척에 새로 생긴 중국집이 반갑지 않을 리 없다.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하니까 배달은 아예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모내기하느라 바쁘다고 논 으로 짜장면 좀 보내달라는데 모른 체할 수가 있나. 하는 수 없이 배달을 하기 시작했지.” 장면으로 채우고, 발 푹푹 빠지는 논두렁에 들어가야 하니 장화로 무장하고, 아내가 직접 담근 짭짤한 김치도 한사발 잊지 않고 챙겨서. 배달이 들어오네. 요 며칠 우리도 덩달아 바빴지.” 갑자기 길 쪽에서 인기척이 난다. 단다. 손을 탈탈 털고 일어나던 아내가 한마디한다. 
은 이들이 인근에서 배추모종 내고 있을 동네 젊은 부부를 불러낸 것. 바빠졌다. 팔팔 끓는 물에 면 넣고 돌아서서는 단무지와 양파를 꺼내고 한쪽에는 찬물을 받아 삶은 면 씻을 준 비를 한다. 손님들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냉장고로 가서 음료수를 직접 꺼내고 컵을 챙겨가는 아저씨, 주방으 로 들어와서 김치를 자르고 춘장을 덜어내는 아주머니, 오늘이 처음이 아닌 듯 손길이 익숙하다. 어, 여기가 중국집인데 누가 짬뽕 배달을 시켰단 말인가?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밝혀진 정체는 역시 동네 주민 이다. 어제 논에서 쓰러진 벼를 묶다가 짜장면을 시켜먹었는데 그때 두고 간 철가방을 오늘 가져오면서 농을 친 것이다.
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좁은 홀 안 가득 다시 적막이 들자 아내는 느긋이 밥 한술을 뜬다. 수가 시작되면 다시 장화 신고 논으로 달려가야 할 터.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마침 남편이 볶아 놓고 간 짜장도 얼추 다 썼으니…. 출처:농민신문 |
|||||
| 다음 | |
|---|---|
| 이전 | |
- 담당부서 :
- 기술보급과
- 연락처 :
- 041-940-4762
- 최종수정일 :
-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