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의 문제점이 최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집중 거론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도가 대부분 쌀 포대에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 쌀 산지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농식품위 위원들의 주장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요즘 쌀 산지는 등급 의무표시제로 혼란이 적지 않다. 특·상·보통으로 구분되던 기존 등급은 지난해 11월부터 1~5등급과 미검사로 세분화됐다. 또 등급을 거짓 또는 과대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유통기간 중 품질 하락으로 당초 표시등급과 차이날까 두려워 아예 미검사로 표시하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또 1등급이 최상급이고 그 이하면 질 나쁜 쌀로 인식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중간 이하 등급이면 차라리 미검사로 표시하는 게 판매에 유리하다.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아니라 ‘쌀 미검사 표시제’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돌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심지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고 품질의 쌀임을 인정하는 ‘러브미’ 인증쌀도 등급표시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새 제도의 한계점을 잘 말해주는 사례다.
새 제도가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제가 크다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더구나 이달부터는 품질을 나타내는 단백질 표시까지 의무화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확기에 한꺼번에 출하되는 벼를 단백질 함량에 따라 구분해 보관하기란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많은 쌀들이 단백질도 미검사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단백질은 의무가 아닌, 임의표시 사항으로 두고 지나치게 세분화한 등급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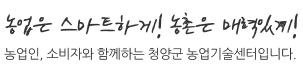
농업새소식
| 제목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쌀등급 의무표시제 | ||||
|---|---|---|---|---|---|
|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2-11-05 | 조회 | 1643 |
| 첨부 |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쌀등급 의무표시제출처: 농민신문
|
|||||
| 다음 | |
|---|---|
| 이전 | |
- 담당부서 :
- 기술보급과
- 연락처 :
- 041-940-4762
- 최종수정일 :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