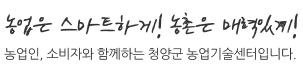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뜯는 족족 반찬, 널린 게 장난감”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남편이니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여보, 우리도 주말농장 해보자!”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직장맘 신연아씨(42·인천 부평구 부평동)는 매몰차게 거절하는 대신 영리하게 맞받아쳤다. “난 애랑 놀 테니까 일은 당신이 혼자 하기. 약속!”
그런데 웬걸? 상추·감자·깻잎·토마토·고추 등을 철 따라 따 먹고 캐 먹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다. “이거 완전 무농약이에요” 하며 이웃에 인심 쓰는 것도 으쓱했다. 반면 ‘애랑’ 놀아 줄 일은 없었다. 딸아이는 다른 밭 애들이랑 신나게 뛰어다니거나 혼자서도 지렁이랑 재밌게 놀았다.
“돈 안 들이고도 잘 먹고 잘 노니 참 좋죠. 올해 농사일도 벌써 기다려지네요.”
◆“사색의 공간이자 만남의 장”
은퇴 준비 차원에서 주말농장을 찾는 이도 많다. 지난해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부학교에 등록해 텃밭을 분양받은 이영철씨(54·인천 서구 석남동)도 그런 사례.
“2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저에게 텃밭은 특별한 곳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앞날을 차분히 설계하게 되지요.”
귀농을 하게 될지 어떨지 아직은 모른다는 이씨. 하지만 당장은 텃밭에 가는 것 자체가 즐겁단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다. 은근히 경쟁하고 견제하는 사업상의 지인들과 달리, 텃밭 이웃들은 만나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한다고.
“지난해 한창 가물었을 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옆 밭에 물을 뿌려 줬어요. 그게 사람 사는 맛 아니겠어요?”
◆“일단 재밌다, 이젠 궁금하다”
‘레알텃밭학교’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농사강좌다. 2010년 서울 고려대에서 시작된 이래 전국 여러 대학에서 5회를 거치며 400명 가까운 수강생을 배출했다. 스스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이 청년들이 올해 초 또 일을 벌였다.
“친구들이 하나둘 졸업하면서 대학 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씨앗들협동조합을 만들었지요.”
텃밭학교 기획자이자 협동조합 발기인인 곽봉석씨(28·서울 마포구 창전동)는 올 초 취직한 새내기 직장인. 업무 익히기도 바쁠 텐데 농사에 협동조합까지…. 거창한 계획 아니면 음흉한 꿍꿍이라도?
“친구들과 농사짓는 게 재밌어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뭘 할 거냐고요? 저도 궁금해요. 재미있고 궁금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