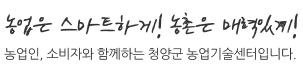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불안한 생산기반=지난해 식량자급률 45.3%는 10년 전인 2002년(58.3%)과 비교해 13%포인트나 하락한 수준이다.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1990년만 해도 70%를 웃돌던 식량자급률이 불과 20여년 만에 45% 선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더구나 해외 곡물 조달능력도 취약한 실정이다. 식량위기가 고조되자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곡물자주율은 2010년 28.2%에서 2012년 24.6%로 하락했다.
이는 우리나라 스스로 식량을 제대로 조달할 능력도, 부족한 곡물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들여올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기상여건과 밀접한 식량생산의 불안정 때문이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된 탓도 크다. 100%를 웃돌던 쌀 자급률이 2011년 83%까지 떨어지고 지난해도 86%에 그친 것은 생산기반 약화의 영향이 크다. 1990년대 초반 120만㏊를 웃돌던 벼 재배면적은 농지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 등으로 지난해 84만9172㏊로 줄었다. 이 영향으로 시장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쌀 재고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식량 생산기반 확대 노력도 헛바퀴만 돌렸다. 정부는 바닥까지 떨어진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생산을 적극 유도했으나 취약한 소비기반에 막혀 밀 자급률은 1%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대책 효과는=문제는 앞으로도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회복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벼 재배면적의 경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84만9172㏊에서 올해 83만2625㏊로 또다시 1.9% 감소했다.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이다. 최근 10년 동안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1만8340㏊씩 감소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생산불안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 생산기반이 계속 악화되자 새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정당국은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농지전용을 최소화하고 유휴농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데다 농지총량관리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안에서도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우려를 더한다. 농정당국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밭직불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예산당국은 재정부담을 내세우며 고개를 젓고 있다. 당장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점을 두고 부처간 입장이 엇갈려 있다. 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밭직불금 지원방안도 실행이 불확실하다. 예산 뒷받침 없이 농정당국 의지만으로는 식량자급률 제고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범정부 대책 절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초 농업전망에서 “쌀 자급률이 낮아진 것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경연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쌀 이외 곡물들의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수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식료품값이 급등하고 불안심리가 확산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정책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새정부의 농정비전 성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준비하면서 자급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농가소득안정 방안과 농가 조직·규모화, 산지유통시설 및 소비기반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농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2011년 정부의 식량 및 곡물자급률 목표 상향조정 이후 오히려 자급률이 후퇴한 것이 이를 나타낸다.
양정 전문가들은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기반 확대에 필수적인 적정 농지면적 확보와 생산 유인을 위한 농가소득안정, 소비기반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맞춰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