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은 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농업의 6차산업화’가 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와 신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닮은 듯 다른 한·중·일 3개국의 농업 6차산업화 현황을 들여다봤다.
◆한국=우리나라의 농업 6차산업화 정책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 간 융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촌에도 6차산업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7월 6차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올 5월2일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제’ 등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들도 속속 시행되고 있다<2면 기사 참조>.
자연히 6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단위에서 6차산업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그러나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뺀 나머지 2·3차 산업 농가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면, 6차산업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2005년 10만3981호(전체 농가의 8.2%)에서 2010년 16만2640호(13.8%)로 크게 늘었다. 같은 전체 농가수가 127만2908호에서 117만7318호로 8%가량 줄어든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세다.
◆일본=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농가소득 감소, 고령화와 경작포기지의 증가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공격적 농림수산업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바로 ‘농업의 6차산업화’이다. 2011년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이 마련된 이후부터는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6차산업화 플래너 제도’나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6차산업화 플래너란 지원센터에 등록돼 파견된 중소기업진단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각 농가의 요청에 따라 가공·판로개척·위생관리·경영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6차산업화에 대한 자문과 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는 농업인과 2·3차 산업의 사업가가 서로 출자한 합작 사업체에 대해 자금을 출자·지원하는 제도로 재무상황이 취약한 농업인도 적은 자금으로 보다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본 정부는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농업인과 다양한 사업자의 연계를 도모해 6차산업화 규모를 현재 약 1조엔에서 2020년까지 약 10조엔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중국=중국 농업의 6차산업화는 한국·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직까지 6차산업이라는 용어도 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리우 징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박사는 “6차산업은 농업을 포함한 사회·경제 개발 수준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농업 운영 방식”이라며 “시장지향적이며 경제적 이익에 중심을 두고 가공업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중국의 현재 6차산업화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1·2·3차 산업의 융복합이라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농업 현대화·선진화 정책에 가까운 수준인 셈이다. 용어도 6차산업화보다는 ‘농업산업화’를 주로 사용한다.
중국 농업산업화의 핵심은 국가중점용두기업(용의 머리처럼 농가를 선도하는 기업)이라 칭하는 선도기업들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3000만위안의 자금을 배정해 선도기업에 지원하며 중국 농산물과 식품 생산, 유통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게 했다. 거의 모든 농업산업화 정책들은 이들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012년 기준 용두기업이 제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은 전체 농산물 시장 공급량 가운데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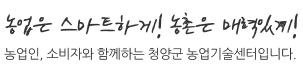
농업새소식
| 제목 | 한·중·일 농업 6차산업화 현황 | ||||
|---|---|---|---|---|---|
|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4-06-16 | 조회 | 1403 |
| 첨부 | |||||
한·중·일 농업 6차산업화 현황동북아농정연구포럼 심포지엄한국…농촌융복합지원법 신설…참여농가도 크게 늘어 |
|||||
| 다음 | |
|---|---|
| 이전 | |
- 담당부서 :
- 기술보급과
- 연락처 :
- 041-940-4762
- 최종수정일 :
- 2025-09-11